이 꽃이 무슨 꽃일까?
고개 숙인 하얀 꽃을 보며 갸웃거리다가 별꽃이라 이름을 붙였다.
꽃잎 다섯 개가 별처럼 확연하니 별꽃이라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으리라.
나는 가끔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혼자 이름을 지어보곤 한다.
물론 돌아서는 순간 금방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애기똥풀이니 매발톱이니 본래의 이름을 알고 나면
내가 붙인 이름은 너무 민밋하여 부끄럽기 그지없다.
화순 만연산을 넘어 지금은 사라진 무등산자락의 목장을 기웃거리다
안양산 휴양림을 거쳐 이서로 들어섰다.
팔순 노모와 친구 분들을 모시고 재롱잔치 차 드라이브를 나선 길이다.
이 곳 저 곳 물 잡아놓은 논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고 누릿하게 익어가는
보리밭이 후끈하게 더위를 몰고 온다.
농부들의 바쁜 일손을 곁눈질하는 우리 모습이 들킨 것 같아 민망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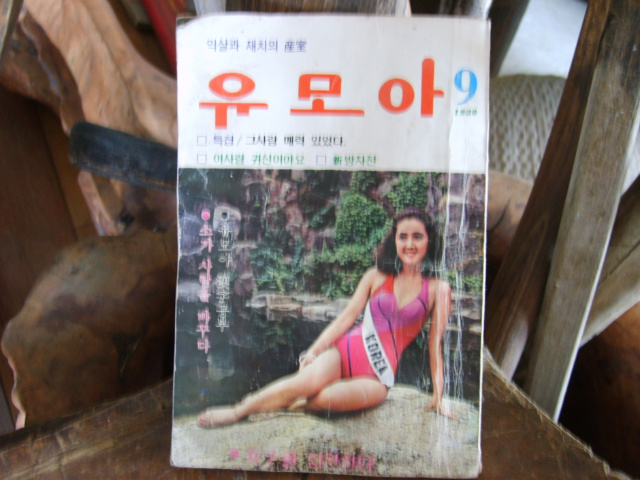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떠오른다.
보리 베기가 한창이던 이맘때쯤 지석강 둑방으로 양산을 쓴 처녀가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인간파철이라며 혀를 차더니 다시 허리를 굽혀 보리를 베셨다.
기계화가 안 되고 일손이 귀하던 때라 일요일을 기다렸다가 자취방에서
돌아온 우리들을 논밭으로 몰고 갔던 그 시절에 레저가 어디 있고
휴일은 얼어 죽을 휴일이던가?
바쁜 일손에 부지깽이도 춤을 추는 판인데 바람난 처녀가 양산을 받치고
걸어가고 있으니 하는 말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런 아버지의 억척이 싫어 확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때를
떠올리니 나는 지금 호강에 초친 게 아닌가 싶어 죄스럽기 짝이 없다.
“어무니. 저 꽃 이름이 뭐여?“
”엉. 때죽나무“
때죽나무? 이름한번 희한하고 누가 지었는지 촌스럽기 그지없다.
내가 지은 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때죽나무는 마치 마구간에 들어 설 때처럼 두엄 익는 냄새를 풍긴다.
그런데 그 꽃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어 꽃술을 보려면 민망하게도
치마를 들치고 내밀한 곳을 들여다보듯 올려봐야 한다.
이서초등학교 앞에 다다르자 설봉원을 들르자며 차를 세우란다.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 가마골의 용소를 가려든 참인데 어차피
바람 쐬는 길이니 쉬어간들 어떠랴.
“설봉원이 뭐하는덴디?”
“아 거 뭣이냐. 독탑 쌓아 놓은 곳”
초등학교 뒤편으로 돌아서자 밭에 심은 작약이 화류계 여인처럼
루즈를 바르고 우리를 맞는다.
근데 작약을 보면 왜 화투가 떠오르는 걸까?
5월 난초, 6월 목단인데 작약은 왜 화투 패에서 왕따 당한 걸까?
4월 흑싸리, 7월 빨강싸리이면 한자리 차지할 만도한데
그 축에 못 낀 것은 아마 조상이 타협할 줄 몰랐나보다.
“설봉 선생님 자동차 있다.”
“오늘 정말 운이 좋네.”

‘雪峰苑설봉원‘이라 음각된 바위 옆에 엉덩이를 까고 서있는 허름한
무쏘를 보고 하는 말이다.
사전에 방문하겠다는 약조를 받지 않고는 구경할 수없다는데
정말 운이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곳일까?
돌탑 쌓는 취미를 갖고 있는 노인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쩐지
귀에 선다.
혹시 설봉이라는 분이 사이비 교주처럼 혹세무민 하는 건 아닐까?
얼어 죽을 선생이라니 팔순 노인들이 인기연예인 만난 소녀들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피식 웃음을 흘리며 엄니들 기분 맞추는데
인색하랴 싶어 사진 몇 컷 찍을 요량으로 들어섰다.
입구에는 늙은 장승이 힘없이 웃으며 우리를 맞는다.
발걸음을 들여 놓자 수많은 돌탑들이 오밀조밀 모여 구구단을 외는
초등학생들처럼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듯싶다.
돌도 주인을 잘 만나면 생명을 얻는 걸까?
아! 돌을 주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을 받드는 사람도 있구나.
돌탑 사이사이에는 하늘로 뻗지 못한 나무들이 뱀처럼 누워있다.
돌탑에 넋을 잃고 전시관으로 들어서니 설봉선생이라는 분이 우리를 맞는다.
그분은 소일삼아 틈나는 대로 이곳에 들러 시간을 보낸단다.
거실이건 안방이건 온통 우리의 옛것들이 눈을 말끄러미 뜨고 반기더니
동무하고 놀자며 금세 나를 초등학교 어린애로 만들고 만다.

‘공민’이라는 교과서, 구구단이 적힌 오래된 책받침, 벤또(도시락),
교복, 교모, 색동저고리, 기계 독 오르던 이발기계, 똥장군, 합수 푸던 조대,
청년시절 손금이 닳도록 타맥하던 발동기.....
난 차마 소중한 유년의 기억을 잃어버릴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유년의 기억 속에 풍덩 빠져 넋을 놓고 있으니 또 하나 내 눈길을
붙드는 것은 그리도 갖고 싶었던 꽃 구슬이 가득담긴 그릇이었다.
정말 神이 있다면 날 그 시절로 돌려 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떼를 쓰고 싶다.
내가 이러할 진제 엄니와 친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왜 설봉이라는 노인은 나를 과거로 되돌려 놓는가?
설봉 이동근 선생과 마주하고 앉았다.
37살 청년시절 우연히 돌과 옛것들에 혼을 빼앗겨 30년이 넘도록
가꾸고 보살펴 오늘의 이곳을 만들었단다.
묘목을 심고 벌어진 가지 사이에 돌을 올려놓으니 돌과 나무가
한데 어울려 사이좋게 살더란다.
수박을 내놓는 그분에게 단돈 만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자존심을
상할까봐 머뭇거리며 간식을 뺏어 먹자니 염치가 美製다.

이 곳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에 그렇잖아도 군청에서
다녀갔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이 안 된단다.
돌탑과 옛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있을까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개인이 소장한 희귀한 자산을 기증하기 전에는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외국 관광객에게 소개해도 손색없을 이곳이 관광지로 지정받을 날은
언제쯤일까?
설봉선생님 부디 건강하소서!

'여행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는 추억을 만들려고 사는거 아닐까? (0) | 2008.08.29 |
|---|---|
| 여수의 사랑 (0) | 2008.07.21 |
|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살아간다면.... (0) | 2007.10.29 |
| 쓰지 못한 가을동화 (0) | 2007.10.03 |
| 대천 해수욕장의 동백아가씨 (0) | 2007.09.18 |








